
글로벌 금 투자 열기가 실물연계자산(Real World Asset·RWA)으로 확산되며 관련 시장 규모가 3조 원에 육박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는 토큰증권(STO) 규제 공백이 장기화되면서 급성장 흐름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가상자산 정보업체 코인게코에 따르면 전 세계 토큰화 금 시가총액은 약 2조 9000억 원을 넘어섰다. 지난 1월에 비해 약 23% 급증한 규모다. 토큰화 금은 실물 금을 블록체인 기반으로 토큰화한 것으로, RWA로 분류된다. 24시간 연중무휴 거래가 가능하고 수수료가 낮다는 점이 강점이다. 특히 최근 미국 행정부가 촉발한 무역전쟁 여파로 가상자산 시장에서도 토큰화된 금이 안전자산으로 떠올랐다는 분석이 나온다. 라이언 리 비트겟 수석 애널리스트는 “토큰화 금은 전통 금융의 안정성과 웹3 기술을 연결하는 RWA 자산으로 가상자산 투자자들에게 헷지 수단이 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토큰화 금 수요 확대에 따라 거래량도 급증했다. 이날 디파이라마에 따르면 시가총액 1위 테더골드(XAUt)의 일일 거래량은 2224만 달러(약 315억 원)로 연초 대비 약 4배, 시총 2위 팍소스골드(PAXG)는 8145만 달러(약 1156억 원)로 약 6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주 전체 주간 거래량은 10억 달러(약 1조 4250억 원)를 돌파하며 2023년 이후 2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국내 상황은 이와 온도차가 크다. STO 법안이 국회에 장기간 계류되면서 시장 기반이 제대로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토큰증권과 블록체인에서 토큰화된 자산을 구분하는 명확한 법적 기준이 부재한 상황이다. 이에 토큰화된 금도 증권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제재 위험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광고·마케팅은 물론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 상장도 쉽지 않아 투자자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증권성 이슈를 피하기 위해 국내 토큰화 금 프로젝트는 복잡한 거래 구조를 유지하며 투자자 진입장벽을 더욱 높이고 있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운영 중인 ‘센골드’는 투자자가 플랫폼에서 직접 토큰화 금(GPC)을 거래할 수 없도록 했다. 대신 투자자는 ‘e골드’라는 디지털 금 교환권을 먼저 구매하고 이를 NFT 형태의 ‘골드디지털바우처’로 교환한다. 이후 이 NFT를 다시 탈중앙화금융(DeFi·디파이) 플랫폼 ‘골드스테이션’에서 GPC로 전환해야 한다.
이 같은 설계는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구조 △타인(플랫폼 운영자 등)에 의해 관리·운용되는 구조 △제3자 간의 거래 및 유통 구조를 포함할 경우 자본시장법상 증권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당국의 증권성 판단 기준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투자자 간 직접 거래를 차단하고, 플랫폼 내 단계적 절차를 거쳐 실물 금 연동성을 강조하는 방식이다.
앞서 지난해 10월 센골드는 운영 주체를 부산 디지털자산거래소(비단)로 이관하겠다고 발표하며 제도 리스크 완화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사업 이관은 수개월째 진전 없이 답보 상태다. 비단 관계자는 “거래소가 컨소시엄 형태로 운영되면서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거쳐야 하는 절차상 이슈가 있었다”면서 “조만간 이관 완료 및 정식 서비스 출시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업계는 가장 시급한 과제는 STO 법안의 국회 통과라고 입을 모은다. 기술력과 시장 수요가 충분한 상황인데도 제도 미비로 또다시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이다. 한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토큰화 금은 디지털 환경에서 실물 자산을 편리하게 거래하려는 수요에 기반한 시장"이라며 “제도 미비로 사업자들이 방어적 운영을 지속하면 확장성 면에서 한계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전 세계가 RWA를 중심으로 새로운 자산 시장을 열고 있는 만큼, 한국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제도적 대응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 김정우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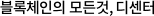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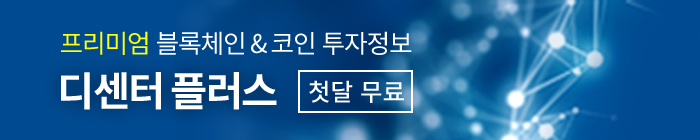

![비트코인, 8만 달러 중반 횡보 지속…최대 규모 옵션 만기 압박 [디센터 시황]](https://newsimg.sedaily.com/2025/12/26/2H1VOIC7YM_3_s.jpg)

![美증시 산타랠리에도 가상화폐 제자리…투자심리 '극도의 공포' [디센터 시황]](https://newsimg.sedaily.com/2025/12/23/2H1UBAZ2MQ_1_s.png)



![비트코인 8만8천달러 박스권…"연말 반등" vs "추가 조정" [디센터 시황]](https://newsimg.sedaily.com/2025/12/22/2H1TU3YMBP_1_s.png)
![스테이블코인 인프라 전쟁…아발란체, 글로벌 제도권서 존재감 확대[알트코인 포커스]](https://newsimg.sedaily.com/2025/12/09/2H1NXC67HB_4_s.png)

![원화코인, 커지는 핀테크 역할론 [기자의눈]](https://newsimg.sedaily.com/2025/12/08/2H1NGBQUJM_2_s.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