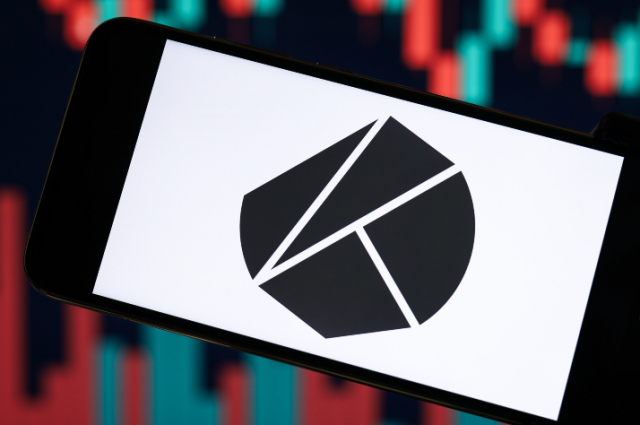
대표적인 국내 블록체인 프로젝트 클레이튼(KLAY)의 운영사가 크러스트에서 클레이튼 재단으로 바뀐다. 클레이튼은 지난 2019년 카카오가 블록체인 기술 계열사 그라운드X를 통해 출시한 블록체인이다. 지난해 그라운드X에서 싱가포르 법인 크러스트로 운영권이 넘어간 뒤 고작 1년 만에 다시 한 번 운영사가 바뀌는 것이다.
클레이튼의 잦은 손바뀜을 바라보는 시각은 그리 우호적이지 않다. 최고가 대비 70% 이상 가격이 내려앉은 채 돌파구가 보이지 않자 근본적인 해결은 접어두고 보여주기식 조치만 내놓는다는 비판도 나온다. 실제 지난 20일 클레이튼 재단은 이번 이관 때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 사업 등 주요 서비스 지원 인력은 크러스트에 남는다고 밝혔다. 클레이튼 쇄신을 위한 운영사 교체지만 정작 핵심 인력은 빠지는, ‘속 빈 강정’ 식 변화인 셈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유를 알 수 없는 운영사 교체가 계속 이뤄지는데 기존 운영사(그라운드X·크러스트)들이 ‘이미지 세탁’을 위해 폭락한 클레이튼을 떼어 내는 것으로 의심된다”고 전했다.
크러스트는 이번 운영사 이관 이유로 카카오와 지분 관계가 없는 독립법인 클레이튼 재단 중심의 ‘탈중앙화’를 내세웠는데 이 역시 설득력이 떨어진다. 클레이튼의 거버넌스 위원회를 지금 31개 기업의 컨소시엄 형태에서 일반 사용자까지 참여하는 ‘퍼미션리스 블록체인’으로 바꾼다는 계획이지만 탈중앙화를 담보하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목소리다. 일반인이 GC에 참여하려면 일정량 이상의 클레이튼을 확보해야 하는데, 자금력이 상당하거나 클레이튼 재단과 깊은 관계가 있지 않는 이상 현실적으로 GC가 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클레이튼 가격 회복 시점을 예상하기 힘든 상황에서 GC 참여 기준 이상의 클레이튼을 보유하는 것 자체도 리스크다. 이 때문에 업계에선 퍼미션리스 블록체인을 통한 탈중앙화는 사실상 말장난에 가깝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클레이튼이 탈중앙화에 나설 만큼 기술적 성숙기에 도달했는지 여부도 의견이 분분하다. 타 블록체인 대비 잦은 네트워크 장애는 클레이튼의 고질적인 문제로 꼽힌다. 네트워크 장애가 연이어 발생하자 지난해 클레이튼 기반의 대표 프로젝트인 메타콩즈와 실타래 등이 생태계를 이탈하기도 했다. 클레이튼 가격 급락으로 클레이튼 기반 탈중앙화금융(DeFi·디파이) 서비스들이 부진하면서 디파이 예치금 규모도 지난해 초 13억 달러에서 1억 달러대로 10분의 1토막났다.
클레이튼 재단은 다음달 6일 기자 간담회를 연다. 기존 크러스트 운영 체제와 확실하게 구분되는 클레이튼 재단만의 역할과 인력 구성을 투명하게 밝히지 않는다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의 탈중앙화 논란이 잦아들지 않을 것이다.

- 김정우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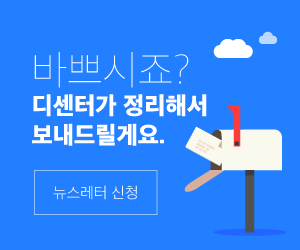

!["스테이블코인, 지역화폐를 디지털자산으로 확장" [디센터 인터뷰]](https://newsimg.sedaily.com/2025/12/22/2H1TU26V62_5_s.jpg)
![비트코인, 8만 달러 중반 횡보 지속…최대 규모 옵션 만기 압박 [디센터 시황]](https://newsimg.sedaily.com/2025/12/26/2H1VOIC7YM_3_s.jpg)



![비트코인 8만8천달러 박스권…"연말 반등" vs "추가 조정" [디센터 시황]](https://newsimg.sedaily.com/2025/12/22/2H1TU3YMBP_1_s.png)
![스테이블코인 인프라 전쟁…아발란체, 글로벌 제도권서 존재감 확대[알트코인 포커스]](https://newsimg.sedaily.com/2025/12/09/2H1NXC67HB_4_s.png)

![원화코인, 커지는 핀테크 역할론 [기자의눈]](https://newsimg.sedaily.com/2025/12/08/2H1NGBQUJM_2_s.jpg)







